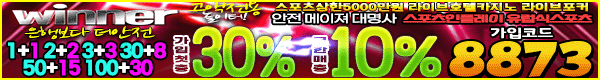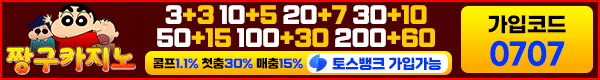보쌈당한 과부의 전락(轉落) - 중편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274 조회
-
목록
본문
사실 김생원은 사람을 시켜 홍씨를 보쌈해 오게는 했지만 그녀가 강제로 업혀 온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를 구슬러서 같이 살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뜻밖에 알몸으로 기어나오는 것을 보자 그리 정숙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이 생겨서 여유있는 태도로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기가 누구라는 말과 재산이 꽤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없다는 것, 그리고 예전부터 그녀의 용모와 자태를 흠모해 왔었다는 것,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청상과부로 평생을 지내는 것보다 이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소리까지 했다. 그러나 홍씨는 수치심에 몸을 웅크리고 눈과 귀를 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에 "발가벗고 있는 꼴을 보니 어차피 댁도 지금까지 그다지 절개를 지킨 것 같지 않은데 피차에게 잘 된 일 아니오?"하는 비웃음이 섞인 말은 그녀의 따귀를 때리듯이 귀에 들어왔다. 홍씨는 자기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아 그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제발... 불 좀... 불 좀 꺼 주세요..."하고 애원했다.
김생원은 불을 꺼 달라는 건 당연히 몸을 허락하겠다는 소리구나 싶어서 소원대로 촛불에 손을 갖다대어 끄려고 했다. 그런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몸매가 하도 예뻐서 한번 만져나 보고 싶어 손을 들어 과부의 궁둥이를 슬쩍 쓰다듬었다. 그러자 그녀가 몸을 움찔하며 엉덩이를 들어올렸는데 그녀의 음문에 깊이 박혀있던 된 나무로 된 검붉은 양물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는 이 꼴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연모했던 여자가 이렇게 음란한 계집이었나?" 그러나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일이라 손으로 그 막대기를 붙잡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부는 점차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꼬아댔다. 그러자 김생원은 더 참지 못하고 막대를 빼어버린 후 자신의 양물을 그녀의 음문에 쑤셔박고는 개끼리 하는 자세로 공격을 시작했다.
홍씨도 이에 응하여 갖가지 요분질에 감창소리를 내며 김생원과 정사를 나누었다. 이리하여 한 시간이 넘게 그간 쌓아온 정력을 방출한 김생원이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과부는 알몸에 다리를 활짝 벌려 보기 흉한 부위를 훤히 드러낸 채로 침까지 흘리며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혀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새장가를 들고자 했던 것이지 하룻밤을 보낼 계집을 구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안사람으로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음탕한 계집인 줄은 몰랐구나. 이런 천한 것을 내실에 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김생원에게는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하는 집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이제 육십을 막 넘긴 중늙은이였는데 10년전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김생원은 홍씨가 잠들어 있는 별채방을 몰래 빠져나와 그 집사를 불러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자네가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웠는데 마침 계집 하나를 구했으니 자네도 한 번 맛을 보고 괜찮으면 데리고 사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을 들은 집사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홍씨가 알몸으로 다리를 활짝 벌린 채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만에 여체를 대하자 갑자기 음심이 동하여 과부를 끌어안고 잔뜩 발기된 양물을 그녀의 음문에 쑤셔박은 후 왕복운동을 하다가 10년이 넘게 쌓인 정액을 한꺼번에 그녀 몸속에 쏟아넣었다. 그리고 나서 정욕이 만족되자 그도 김생원의 의도를 깨닫고는 "흥! 나한테 저 천한 년을 맡기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하고 속으로 몰래 비웃었다. 그는 바로 소리없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열세살 된 가동(家童)을 불렀다.
"얘야. 너도 전부터 동무들과 계집 맛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 가동이 갑작스런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대답을 못하자 집사는 웃으면서 "그렇게 부끄러워 할 것 없다. 마침 저 건너방에 계집이 하나 누워 있으니 너도 한번 맛을 보려무나."하고 어깨를 두덕거려 주고는 가버렸다.
가동이 어리둥절한 채로 별채방으로 가서 그 안을 들여다 보니 생전 처음보는 여체가 다리를 벌린 채 그 사이에서 허연 액체를 줄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자 아이도 갑자기 솟구치는 정욕을 참을 수 없어서 방안으로 들어가 바지춤을 내리고 그의 덜 여문 음경을 과부의 정액이 흘러나와 미끌거리는 음문 속에 집어넣고 말았다. 아직 경험이 없었던 그는 몇 번 왕복을 하지도 못하고 그만 사정을 해 버렸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정신없이 첫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일을 마치고 나자 이런 천한 계집의 더러운 가랑이에 자신의 동정을 바쳤다는 사실이 스스로 역겨워져서 그녀의 얼굴에 침을 탁 뱉고는 방을 나갔다. 그러고는 머슴 방으로 가서 잘 알고 지내던 상머슴을 불렀다.
"형님. 드릴 말이 있어요." 그러고는 방금 겪은 일을 말하고는 아직도 그 여자가 건너방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머슴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보기로 했다. 상머슴은 별채방으로 들어가 과부의 알몸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양물이 곤두서서 그 자리에서 여자를 덮쳤다. 그는 건장한 사내놈이었고 물건도 큰 편이었으나 과부는 이미 음문이 많이 넓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즐길만한 쫄깃한 맛이 없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다시 방을 나와 평소에 같이 놀던 친구 세 명을 불러냈다.
"야. 세상에 이런 계집도 다 있더라" 하면서 그녀를 소개하고는 한번 같이 놀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자 바로 이들과 함께 다시 김생원의 별채방으로 들어가 돌아가면서 과부를 겁간해 대었다. 그 다음엔 과부를 엎드려 놓게 하고는 아래 위 양쪽으로 동시에 욕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머슴들은 그녀에게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붓고는 전부 기진맥진하여 누워서 한동안 쉬었다.
그리고 나서 머슴과 친구들은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엉뚱한 제안을 했다. "아랫마을에 사는 꼽추 녀석에게도 그년 맛을 한번 보여주면 어때?"
그 마을에는 젊은 꼽추가 하나 살았는데 어릴 때 그 어미가 버리고 달아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해 연명하고 있었다. 그 꼽추는 덩치는 컸지만 목은 어깨뼈 속에 주저앉아 있었고 등뼈는 절반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그 위에 튀어나온 거대한 혹은 머리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 있었다. 시꺼먼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다리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몹시 짧았다. 그 커다란 얼굴에 한쪽 눈은 큰 사마귀 밑에 짜부라져 있는 데다가 코는 한쪽으로 비틀어지고 입술은 양쪽으로 쪼개진 쌍언청인데 누런 이빨은 듬성듬성 나 있었고 한쪽 이빨만 멧돼지 어금니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꿈에 볼까 두려울 정도로 흉하게 생긴 사내였다. 꼽추는 힘은 엄청나게 셌지만 바보에 귀머거리인데다가 정신까지 약간 이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꼽추가 스무살이 넘자 꼴에 사내라고 슬슬 계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여인이 지날 때마다 궁둥이를 움켜쥔다거나 뒤에서 껴안으려고 들어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얌전하게 만들려면 계집을 붙여줘야 할 텐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이런 놈하고 그 짓을 할 창녀는 없을 테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의논해도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머슴들은 술김에 의기가 투합해서 바로 그 꼽추의 움막으로 달려갔다. 그는 막 동냥으로 얻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은 귀머거리 꼽추에게 손짓발짓으로 말을 걸고는 간신히 달래어 이 집의 별채 건너방까지 오게 했다. 꼽추는 영문도 모르고 사내들을 따라왔는데 별채방에 누워있는 과부의 알몸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고 코를 실룩거리다가 다짜고짜 그녀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김생원은 불을 꺼 달라는 건 당연히 몸을 허락하겠다는 소리구나 싶어서 소원대로 촛불에 손을 갖다대어 끄려고 했다. 그런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몸매가 하도 예뻐서 한번 만져나 보고 싶어 손을 들어 과부의 궁둥이를 슬쩍 쓰다듬었다. 그러자 그녀가 몸을 움찔하며 엉덩이를 들어올렸는데 그녀의 음문에 깊이 박혀있던 된 나무로 된 검붉은 양물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는 이 꼴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연모했던 여자가 이렇게 음란한 계집이었나?" 그러나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일이라 손으로 그 막대기를 붙잡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부는 점차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꼬아댔다. 그러자 김생원은 더 참지 못하고 막대를 빼어버린 후 자신의 양물을 그녀의 음문에 쑤셔박고는 개끼리 하는 자세로 공격을 시작했다.
홍씨도 이에 응하여 갖가지 요분질에 감창소리를 내며 김생원과 정사를 나누었다. 이리하여 한 시간이 넘게 그간 쌓아온 정력을 방출한 김생원이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과부는 알몸에 다리를 활짝 벌려 보기 흉한 부위를 훤히 드러낸 채로 침까지 흘리며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혀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새장가를 들고자 했던 것이지 하룻밤을 보낼 계집을 구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안사람으로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음탕한 계집인 줄은 몰랐구나. 이런 천한 것을 내실에 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김생원에게는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하는 집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이제 육십을 막 넘긴 중늙은이였는데 10년전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김생원은 홍씨가 잠들어 있는 별채방을 몰래 빠져나와 그 집사를 불러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자네가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웠는데 마침 계집 하나를 구했으니 자네도 한 번 맛을 보고 괜찮으면 데리고 사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을 들은 집사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홍씨가 알몸으로 다리를 활짝 벌린 채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만에 여체를 대하자 갑자기 음심이 동하여 과부를 끌어안고 잔뜩 발기된 양물을 그녀의 음문에 쑤셔박은 후 왕복운동을 하다가 10년이 넘게 쌓인 정액을 한꺼번에 그녀 몸속에 쏟아넣었다. 그리고 나서 정욕이 만족되자 그도 김생원의 의도를 깨닫고는 "흥! 나한테 저 천한 년을 맡기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하고 속으로 몰래 비웃었다. 그는 바로 소리없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열세살 된 가동(家童)을 불렀다.
"얘야. 너도 전부터 동무들과 계집 맛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 가동이 갑작스런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대답을 못하자 집사는 웃으면서 "그렇게 부끄러워 할 것 없다. 마침 저 건너방에 계집이 하나 누워 있으니 너도 한번 맛을 보려무나."하고 어깨를 두덕거려 주고는 가버렸다.
가동이 어리둥절한 채로 별채방으로 가서 그 안을 들여다 보니 생전 처음보는 여체가 다리를 벌린 채 그 사이에서 허연 액체를 줄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자 아이도 갑자기 솟구치는 정욕을 참을 수 없어서 방안으로 들어가 바지춤을 내리고 그의 덜 여문 음경을 과부의 정액이 흘러나와 미끌거리는 음문 속에 집어넣고 말았다. 아직 경험이 없었던 그는 몇 번 왕복을 하지도 못하고 그만 사정을 해 버렸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정신없이 첫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일을 마치고 나자 이런 천한 계집의 더러운 가랑이에 자신의 동정을 바쳤다는 사실이 스스로 역겨워져서 그녀의 얼굴에 침을 탁 뱉고는 방을 나갔다. 그러고는 머슴 방으로 가서 잘 알고 지내던 상머슴을 불렀다.
"형님. 드릴 말이 있어요." 그러고는 방금 겪은 일을 말하고는 아직도 그 여자가 건너방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머슴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보기로 했다. 상머슴은 별채방으로 들어가 과부의 알몸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양물이 곤두서서 그 자리에서 여자를 덮쳤다. 그는 건장한 사내놈이었고 물건도 큰 편이었으나 과부는 이미 음문이 많이 넓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즐길만한 쫄깃한 맛이 없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다시 방을 나와 평소에 같이 놀던 친구 세 명을 불러냈다.
"야. 세상에 이런 계집도 다 있더라" 하면서 그녀를 소개하고는 한번 같이 놀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자 바로 이들과 함께 다시 김생원의 별채방으로 들어가 돌아가면서 과부를 겁간해 대었다. 그 다음엔 과부를 엎드려 놓게 하고는 아래 위 양쪽으로 동시에 욕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머슴들은 그녀에게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붓고는 전부 기진맥진하여 누워서 한동안 쉬었다.
그리고 나서 머슴과 친구들은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엉뚱한 제안을 했다. "아랫마을에 사는 꼽추 녀석에게도 그년 맛을 한번 보여주면 어때?"
그 마을에는 젊은 꼽추가 하나 살았는데 어릴 때 그 어미가 버리고 달아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해 연명하고 있었다. 그 꼽추는 덩치는 컸지만 목은 어깨뼈 속에 주저앉아 있었고 등뼈는 절반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그 위에 튀어나온 거대한 혹은 머리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 있었다. 시꺼먼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다리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몹시 짧았다. 그 커다란 얼굴에 한쪽 눈은 큰 사마귀 밑에 짜부라져 있는 데다가 코는 한쪽으로 비틀어지고 입술은 양쪽으로 쪼개진 쌍언청인데 누런 이빨은 듬성듬성 나 있었고 한쪽 이빨만 멧돼지 어금니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꿈에 볼까 두려울 정도로 흉하게 생긴 사내였다. 꼽추는 힘은 엄청나게 셌지만 바보에 귀머거리인데다가 정신까지 약간 이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꼽추가 스무살이 넘자 꼴에 사내라고 슬슬 계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여인이 지날 때마다 궁둥이를 움켜쥔다거나 뒤에서 껴안으려고 들어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얌전하게 만들려면 계집을 붙여줘야 할 텐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이런 놈하고 그 짓을 할 창녀는 없을 테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의논해도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머슴들은 술김에 의기가 투합해서 바로 그 꼽추의 움막으로 달려갔다. 그는 막 동냥으로 얻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은 귀머거리 꼽추에게 손짓발짓으로 말을 걸고는 간신히 달래어 이 집의 별채 건너방까지 오게 했다. 꼽추는 영문도 모르고 사내들을 따라왔는데 별채방에 누워있는 과부의 알몸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고 코를 실룩거리다가 다짜고짜 그녀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