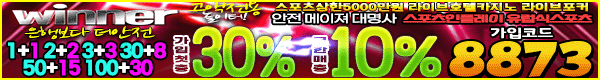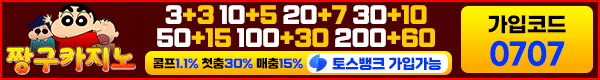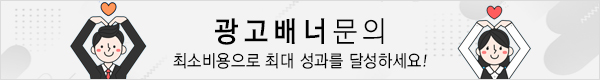Forgotten Battle, 러시아 하늘의 조선인 - 1부11장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734 조회
-
목록
본문
아직 가을기운이 남아있지만, 산중은 엄동에 버금간다. 혈조를 스치고 지나가는 북동풍이 얼마남지 않은 볕기운마저 베어버린다.
- 甲은 陽木이다. 쭉쭉 뻗어올라가는 소나무를 생각해라. 나아감에 있어서는 힘차게!!! 乙은 陰木이다. 논에 있는 벼나 보리, 강가의 갈대를 생각해라 강풍에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 물러설 때는 상대의 힘에 몸을 맞기고 자연스레 빠져라. 丙은 陽火이다…
-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天干(천간)의 뜻에 맞추어 行步(행보)하는 天干步(천간보)는 단순한 10개의 발동작에 지나지 않지만, 순행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 물론 사주에서처럼 마구 섞여있어도 된다. 천간의 양음과 오행에 맞추어 적절한 步(걸음)를 내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인한이형의 구결에 맞추어 천간보를 뛰면서 왜검을 내리쳤다. 왜검은 단순했지만 정교하고 변화가 없지만 그러므로 만변하는 괜찮은 물건이다. 머리, 허리, 손목과 찌르기 단순히 네 동작이지만, 왼손의 새끼손가락으로 방향만 바꾸면 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게다가 밀면 당기고 당기면 미는 단 두 가지 원리만으로도 중국검과 본국검에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제기차기로 익힌 태껸의 발재간까지 섞이면 차고 넘친다. 손재간을 굳이 익히지 않더라도 공격할 방법이 너무 많은 것이다.
오늘은 수현이 올라오는 날이다. 인한이형이 산을 내려간 지 1주 근 삼칠일간 양물을 쓰지 못했다. 아래도리의 양물이 흐물거린다. 검을 내리치고 숨을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의지와 별개인가보다.
아침공양을 마칠무렵이면 올라오던 수현이와 작은보살(소월아씨네 찬모)는 저녁공양이 다 올 때까지 무소식이다. 점심때 작은사형에게 전통을 은근히 부탁했지만, 눈치없는 땡초사형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기다리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검을 내리치고 보를 밟아도 시간은 가질 않는다.
“사제 들어가서 저녁공양 준비해야지?”
“네, 사형”
“오늘은 작은보살님이 꽤 늦는구나. 저녁공양하고 슬슬 공부해야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 않더이까?”
“그래 들어가자 이제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나는 여전히 닭가슴살을 따로 먹지만, 사형들과 사부의 공양 준비는 역시 내 몫이였다. 원체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라 일감은 적지만, 조미를 하지 않는 절간음식은 10여개월간 준비해왔지만, 까다롭기 그지 없다. 任水(임수)를 받아 癸水(계수)로 내려둔 뜨물로 쌀과 산채를 다듬고 작은 솥에 앉힌다. 마늘과 들기름만으로 조리한 산채와 살짝 된 밥을 주발과 트밋그릇에 담아 내면 되는 공양은 보시를 여러해한 보살님들 조차 버거운 일인데 나 같은 초보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이다.
밥이 거의 되었을까 큰 사형이 소채로 급히 들어왔다.
“청풍은 어서 가서 짐을 챙기고. 길주는 밥과 소금만 들고 나오고”
“큰사형!! 무슨 일이오이까?”
“시간이 없다. 어서”
나는 군소리없이 솥뚜껑을 열고 밥을 양푼에 밀어넣고, 찬장에서 소금통을 챙겨 암자 앞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사부는 시주승의 모습으로 바삐나온 기색이 여실하고 큰 사형은 불전함과 책 몇권만을 챙긴 채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직 작은 사형이 나오지 않은 듯 하다. 나는
“사부님 무슨일이오이까?”
“소월아씨네 가게의 전통이 되지 아니한다.”
“그거야…”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색주가에서 이 시간은 가장 바쁜 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각이다. 전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그때 작은 사형이 짐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보퉁이에 싼 내 검과 사부의 죽장, 가죽주머니 몇 개를 든 행색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큰사형은 작은사형의 가죽주머니를 받아 차고 앞장섰다.
“포수마을로 내려간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하자.”
“네”
10개월여간 사부를 봐왔지만, 이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이다. 사부는 앞장을 서 나가면서 큰사형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작은사형은 아직도 어리벙벙한 표정이다.
유약해보이기만 하던 사부의 걸음은 들다람쥐 같은 나와 작은사형이 따라잡기도 버겁다. 짐을 들고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원채 걸음이 빨랐다. 돌부리 투성이인 산허리를 돌아 내려가면서 마치 평지를 걷듯 평안하게 내려간다.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힌 내 발은 점점 아파오는데… 사부는 아무일 없다는 눈치이다. 그때였다.
“사부님 암자를 보십시오.”
“이런…”
내가 10개월여간 살아온 암자가 불타고 있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청풍 그리고 길주는 먼저 포수마을로 들어가라.”
사부는 작은 사형의 가죽주머니를 빼앗아 들고 산허리로 돌아 올라간다. 추격꾼을 따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래도 나를 추적해온 자들인 것 같은데…
“사부 제가 막겠습니다.”
“헛소리 말아라. 나는 막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포수마을로 달려가라”
“그래도 저의 일로 온 자들인 듯 한데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닥쳐라. 군사부 일체라 하였다. 그래도 내말을 거역하겠느냐?”
“그래도 사부님…”
“이봐 사제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뭐하는가?”
작은 사형이 나를 밀쳐냈고 사부는 그 틈에 우리와 거리를 벌렸다. 내려올 때도 빠르기가 우리와 같지 아니하더니 올라가는 속도는 그 배 이상인 듯 했다. 사형에게 이끌려 그리고 사부의 호통에 기가 눌려 나는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한식경쯤 달려갔을까…
- 탕 탕 탕 탕 탕 탕 탕!!!
- 투다다다다, 투다다다, 투다다다…
총소리가 울려내려왔다. 나는 섬?한 생각에 몸을 돌렸지만 작은사형이 나보다 빨랐다.
“사부님께서는 너와 나보고 포수마을로 돌아가라 하셨다.”
“사형 그래도…”
“닥쳐라 사부님의 말을 거역할 생각이냐?”
“사형 사부가 위험합니다.”
“이놈이…”
사형이 왼발로 내 무릅을 누질러왔다. 나는 을보로 피하며 갑보로 사형의 뒤를 향해 뛰어올라갔다.
“사형 가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잡지 마십시오.”
사형을 따돌리고 두어발짝을 내딛었을까 뒤통수가 번쩍하며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To be Continued
덧말 1>>
다음편에서 1부를 마치겠군요.
참 오래 걸렸네요.
덧말 2>>
늑대1004님의 글은 행간을 읽어볼수록 쫀득쫀득 하군염.
근래 보기 드문 끈적한 글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 甲은 陽木이다. 쭉쭉 뻗어올라가는 소나무를 생각해라. 나아감에 있어서는 힘차게!!! 乙은 陰木이다. 논에 있는 벼나 보리, 강가의 갈대를 생각해라 강풍에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 물러설 때는 상대의 힘에 몸을 맞기고 자연스레 빠져라. 丙은 陽火이다…
-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天干(천간)의 뜻에 맞추어 行步(행보)하는 天干步(천간보)는 단순한 10개의 발동작에 지나지 않지만, 순행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 물론 사주에서처럼 마구 섞여있어도 된다. 천간의 양음과 오행에 맞추어 적절한 步(걸음)를 내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인한이형의 구결에 맞추어 천간보를 뛰면서 왜검을 내리쳤다. 왜검은 단순했지만 정교하고 변화가 없지만 그러므로 만변하는 괜찮은 물건이다. 머리, 허리, 손목과 찌르기 단순히 네 동작이지만, 왼손의 새끼손가락으로 방향만 바꾸면 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게다가 밀면 당기고 당기면 미는 단 두 가지 원리만으로도 중국검과 본국검에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제기차기로 익힌 태껸의 발재간까지 섞이면 차고 넘친다. 손재간을 굳이 익히지 않더라도 공격할 방법이 너무 많은 것이다.
오늘은 수현이 올라오는 날이다. 인한이형이 산을 내려간 지 1주 근 삼칠일간 양물을 쓰지 못했다. 아래도리의 양물이 흐물거린다. 검을 내리치고 숨을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의지와 별개인가보다.
아침공양을 마칠무렵이면 올라오던 수현이와 작은보살(소월아씨네 찬모)는 저녁공양이 다 올 때까지 무소식이다. 점심때 작은사형에게 전통을 은근히 부탁했지만, 눈치없는 땡초사형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기다리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검을 내리치고 보를 밟아도 시간은 가질 않는다.
“사제 들어가서 저녁공양 준비해야지?”
“네, 사형”
“오늘은 작은보살님이 꽤 늦는구나. 저녁공양하고 슬슬 공부해야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 않더이까?”
“그래 들어가자 이제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나는 여전히 닭가슴살을 따로 먹지만, 사형들과 사부의 공양 준비는 역시 내 몫이였다. 원체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라 일감은 적지만, 조미를 하지 않는 절간음식은 10여개월간 준비해왔지만, 까다롭기 그지 없다. 任水(임수)를 받아 癸水(계수)로 내려둔 뜨물로 쌀과 산채를 다듬고 작은 솥에 앉힌다. 마늘과 들기름만으로 조리한 산채와 살짝 된 밥을 주발과 트밋그릇에 담아 내면 되는 공양은 보시를 여러해한 보살님들 조차 버거운 일인데 나 같은 초보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이다.
밥이 거의 되었을까 큰 사형이 소채로 급히 들어왔다.
“청풍은 어서 가서 짐을 챙기고. 길주는 밥과 소금만 들고 나오고”
“큰사형!! 무슨 일이오이까?”
“시간이 없다. 어서”
나는 군소리없이 솥뚜껑을 열고 밥을 양푼에 밀어넣고, 찬장에서 소금통을 챙겨 암자 앞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사부는 시주승의 모습으로 바삐나온 기색이 여실하고 큰 사형은 불전함과 책 몇권만을 챙긴 채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직 작은 사형이 나오지 않은 듯 하다. 나는
“사부님 무슨일이오이까?”
“소월아씨네 가게의 전통이 되지 아니한다.”
“그거야…”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색주가에서 이 시간은 가장 바쁜 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각이다. 전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그때 작은 사형이 짐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보퉁이에 싼 내 검과 사부의 죽장, 가죽주머니 몇 개를 든 행색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큰사형은 작은사형의 가죽주머니를 받아 차고 앞장섰다.
“포수마을로 내려간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하자.”
“네”
10개월여간 사부를 봐왔지만, 이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이다. 사부는 앞장을 서 나가면서 큰사형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작은사형은 아직도 어리벙벙한 표정이다.
유약해보이기만 하던 사부의 걸음은 들다람쥐 같은 나와 작은사형이 따라잡기도 버겁다. 짐을 들고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원채 걸음이 빨랐다. 돌부리 투성이인 산허리를 돌아 내려가면서 마치 평지를 걷듯 평안하게 내려간다.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힌 내 발은 점점 아파오는데… 사부는 아무일 없다는 눈치이다. 그때였다.
“사부님 암자를 보십시오.”
“이런…”
내가 10개월여간 살아온 암자가 불타고 있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청풍 그리고 길주는 먼저 포수마을로 들어가라.”
사부는 작은 사형의 가죽주머니를 빼앗아 들고 산허리로 돌아 올라간다. 추격꾼을 따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래도 나를 추적해온 자들인 것 같은데…
“사부 제가 막겠습니다.”
“헛소리 말아라. 나는 막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포수마을로 달려가라”
“그래도 저의 일로 온 자들인 듯 한데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닥쳐라. 군사부 일체라 하였다. 그래도 내말을 거역하겠느냐?”
“그래도 사부님…”
“이봐 사제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뭐하는가?”
작은 사형이 나를 밀쳐냈고 사부는 그 틈에 우리와 거리를 벌렸다. 내려올 때도 빠르기가 우리와 같지 아니하더니 올라가는 속도는 그 배 이상인 듯 했다. 사형에게 이끌려 그리고 사부의 호통에 기가 눌려 나는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한식경쯤 달려갔을까…
- 탕 탕 탕 탕 탕 탕 탕!!!
- 투다다다다, 투다다다, 투다다다…
총소리가 울려내려왔다. 나는 섬?한 생각에 몸을 돌렸지만 작은사형이 나보다 빨랐다.
“사부님께서는 너와 나보고 포수마을로 돌아가라 하셨다.”
“사형 그래도…”
“닥쳐라 사부님의 말을 거역할 생각이냐?”
“사형 사부가 위험합니다.”
“이놈이…”
사형이 왼발로 내 무릅을 누질러왔다. 나는 을보로 피하며 갑보로 사형의 뒤를 향해 뛰어올라갔다.
“사형 가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잡지 마십시오.”
사형을 따돌리고 두어발짝을 내딛었을까 뒤통수가 번쩍하며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To be Continued
덧말 1>>
다음편에서 1부를 마치겠군요.
참 오래 걸렸네요.
덧말 2>>
늑대1004님의 글은 행간을 읽어볼수록 쫀득쫀득 하군염.
근래 보기 드문 끈적한 글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